글을 죽 읽으면서 답답한 얘기를 많이 본다. 극우와 극우가 아닌 것을 구분한 후 ‘진정한 극우’를 격리해 안도감을 가지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극우-포퓰리즘은 그런 게 아니라 극우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방법론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에 가깝다. 분류가 아니라 매커니즘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바이러스든 다들 안심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바이러스는 격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등장하고 오미크론 등의 변이를 거쳤을 때, 만일 바이러스들에게 자의식이 있었다면 모두 무릎을 쳤을 것이다. 인간의 경계심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전파력은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끝없는 변이를 통해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극우가 포퓰리즘과의 결합을 통해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보수정치는 굳이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 정상적인(?) 보수정치와 극우-포퓰리즘 간의 경계는 이제 희미해졌다. 한동훈과 장동혁을 비교해보라. ‘극우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전략은 적나라한 혐오적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 상층 정치의 동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직시하고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모든 것은 유행이므로, 극우-포퓰리즘의 시대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은 무엇인가? 극우-포퓰리즘의 동력은 곧 포퓰리즘의 구도, ‘엘리트 대 다수 대중’이라는 구도에서 ‘다수 대중’의 지위를 극우정치가 자칭하면서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포퓰리즘 비판을 하면 ‘그래서 대안은 엘리트주의라는 거지?’라는 표정을 짓는다. 맨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남의 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글에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물론 이재명 정권이 여론조사상 높은 지지를 얻으며 주류로서 통치 논리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긴장은 이 점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 구도가 ‘엘리트주의 대 포퓰리즘’의 대결을 답습한다는 데 있다. 이 구도에서 통치를 책임지는 세력은 결국 ‘부패한 기득권’의 혐의를 뒤집어씀으로써 장기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돼왔기 때문이다.
사실 포퓰리즘이 상정하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바람직한 결말로 가는 유일한 경우는 앞서 상정한 노골적 권위주의에 기대는 외설적 ‘국가 주권’의 실현이 아니라 지금과 완전히 다른 대안 체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민주주의의 실현, 즉 ‘시민/인민 주권’(장석준) 구현으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선택지를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민/인민 주권’의 자리를 메꾸는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갈구하는 조직된 소비자-투자자 정신이다. 진정한 위기는 여기에 잠복해 있는 게 아닐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91.html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정치 개혁이 민주적 주체의 형성 또는 변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는 사실이다. 즉, 오늘날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참여와 책임에 기반하는 민주주의를 더 심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 정치의 갈등선은 ‘통치-엘리트 대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삼각구도 사이에 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통치-엘리트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대립 구도만 눈에 보인다.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069.html
위의 글은 9월 11일에, 아래의 글은 9월 25일에 인터넷 상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앞의 글에 나오는 ‘장석준’ 대목은 아래 글의 대목을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신인민전선과 국민결집 모두 그 근거를 ‘주권’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다만 ‘주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국민결집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권을 외치며, ‘순수한 프랑스인’의 의지를 온전히 대변하는 강한 국가가 개입하기만 하면 기성 정치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난장판이 해결될 것이라 장담한다. 반면 급진좌파 장뤼크 멜랑숑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인민전선은 ‘시민/인민’ 주권을 주창하며,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부가 부자 증세 등을 과감히 추진한다면 긴축과는 다른 방향에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여기에서 ‘주권’이란 결국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구축된 낡고 단단한 ‘경제’의 세계에 대한 극적인 개입을 뜻한다. 극우파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개입을 실현하려 하고, 좌파는 신인민전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등이 ‘민주적 사회주의’라 칭한 또 다른 방향에서 개입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당장 총선이 다시 실시될 경우, 세 흐름 중 어느 쪽이 앞서 나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프랑스 정치의 주된 대립 선이 이미 마크롱 블록과 나머지 사이에서 신인민전선과 국민결집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앞으로 직면할 선택지이기도 하다.
장선생님은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를 썼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뉴욕 시장 선거든 칠레 총선이든 모두, 이제껏 주류 리버럴이 이끌어 오던 반극우 연합의 성격이 달라질 조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리버럴 대신 탈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좌파가 반극우 정치의 새로운 구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도 이게 특정한 구도를 말하는 거라는 점은 보지 않고 ‘그냥 또 정신승리 한다’는 수준으로 자조하고 마는 게 요즘 분위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사실은 다들 어쩔줄 몰라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무슨 욕을 하나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지. NL욕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하고 사는지 모른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그래도 여기다가 징징거렸더니 오늘 안부를 전해온 분 혹은 분들이 있었는데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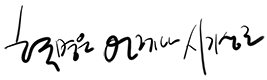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