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그러니까 주로 서구에서 민주주의니 능력주의니 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구도의 얘기를 많이 한다. 능력주의 세계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체제로부터 소외된 것에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여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단아적 지도자를 찾게 됐고 그게 트럼프니 하는 극우포퓰리스트 집권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너무 거칠게 요약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하여간 이런 구도다. 요즘 한겨레신문에 나온 몇몇 분들도 이런 구도의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미국 등 서구 모델에는 맞는 설명일 수 있지만 한국에는 꼭 들어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이런 저런 형태로 했는데,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 얘기를 ‘하이퍼 능력주의’라는, 내 나름의 유머를 섞은 명칭으로 몇 차례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이퍼화… 를 염두에 두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다. 한국 능력주의의 낙오자는 서구와 같은 형태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느끼더라도 다른 방식이다… 인데 제가 서구 전문가들의 입장을 오독한 것일 수 있으니 이해바란다). 오히려 한국 능력주의에서 낙오자는 자신이 낙오된 상황 자체를 더욱 강화되었으면서도 왜곡된, (즉 하이퍼화 된…!) 능력주의적 세계관으로 포섭한다. 그것은 뭐냐, 낙오와 배제를 능력주의 질서 자체의 부당함이 아니라 능력주의 질서 안에서의 부당함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가령 그것은… 나보다 위에 있는 녀석은 나보다 진정으로 실력이 좋아서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부당한 수단을 썼든지 아니면 이 사회의 기준이 잘못됐든지 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진정한 능력주의적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나는 50등이 아니고 최소한 15등은 하는 것이 맞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내 위에 있는 녀석이 부당하게 그 위치에 있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나보다 밑에 있는 녀석은? 그럴만해서 밑에 있는 것이다. 이 밑에 있는 녀석이 부당한 수단(가령 아빠찬스)을 쓰거나 잘못된 기준(가령 할당제)을 갖고 와서 우기는 걸로 내 등수를 위협한다면? 철저히 짓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위에 있는 이가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인정이다. 인정! 이 서사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견결한 능력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한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신실한 능력주의자가 맞느냐? 그건 아니다. 이들은 종종 어차피 뭔가 부당하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을 한다. 가령 이재용. 상대가 이재용인데 아빠찬스라는 둥 할 거냐? 그게 무슨 실익이 있냐? 이재용이 아빠찬스를 써서 회장이 됐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무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재용은 인정한다.
이러한 양상은 자신이 ‘부당한 기득권’의 위치를 차지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가 능력주의 질서 안에서 부당하게 경쟁의 우위를 점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부당한 수단을 써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만약 신실한 능력주의자라면 이런 기회는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회를 움켜 쥔다. 아빠찬스를 쓰면 15등이 아니라 5등이 될 수 있다? 무조건 해야지 임마!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꼬우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그리하여, 내가 볼 적에 한국에 만연한 이러한 하이퍼-능력주의는 위에 대하여 ‘부당한 수단 혹은 잘못된 사회적 기준에 의하여 지위를 획득한 위선적 엘리트’라는 반대해야 할 대상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과, 아래에 대하여 ‘너는 능력이 없으므로 그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 한다는 점에서 혐오 즉 극우적 세계관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이걸 해내는 정치를 한 마디로 압축한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며,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전후의 보수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조직-동원하는 정치(내가 볼 때는 한국형 극우포퓰리즘)를 구사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정치로 조직된 유권자의 목표는 당연히 극우 이념의 관철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위의 상승 및 탈락 방지이다. 이 지위 상승 욕구와 상실 불안을 극우와 연결시키는 수단, 매커니즘이 극우포퓰리즘이다. 이준석이 만든(그가 그렇게 주장하므로) 윤석열의 승리는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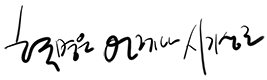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