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태어난 날이다. 나이를 먹으면 보통 큰 의미는 없게 된다. 1983년에 태어난 것으로 행세하고 있으니, 공식적인 나이는 이제 만42세가 되었다. 윤석열이 만나이를 도입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43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1982년에 태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는 44세일 것이다. 위기감이 느껴진다. 뭐 하여간 1만5천7백일이 넘게 살았는데, 여태 생일 타령 하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란 생각도 든다.
그래도 생일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인간은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생일만큼 좋은 핑계가 없다. 생일이니 오랜만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친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고, 괜히 술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고 한 거 아닌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목을 도모할 수 있고…. 여기서, 좋은 기회이니 생일 기념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란다.
하여간… 그런 면에서 볼 때 괜히 생일이 신경 쓰이는 것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비싼 선물을 받았느냐, 축하 메시지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왔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개인적으로) 생일이라고 얘기할 데도 없는 처지가 돼있는 것이다.
뭐 그것도 좋겠지.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으니 이런 것도 이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가령 어느 날 집에서 쓰러져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천만다행으로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블로그에 공지를 해야 되나? 문병오라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관은 누가 들어야 하나? 노제는… 어디를 들러야 하나… 진짜 갈 데가 없네… 어차피 그런 걸 다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건강 생각을 하다 보니 연상이 그쪽으로 된다. 연휴 때에 실컷 자리라 생각했지만 밀린 잠을 자는 개념이었던 하루 이틀을 빼놓고는 5시간 이상 잘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제는 4시간도 못잤는데도 지금까지 눈이 말똥말똥해 이런 낙서나 적고 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도… 반면 자전거에서 떨어진 이후 찰과상 등은 회복이 되었는데, 근육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역시 답은 필라테스일까?
요즘은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 대체 뭘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다. 11월부터는 무언가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어떻게든 겨울을 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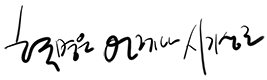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