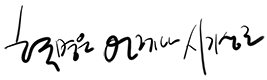기후와 노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김비대위원장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운동권들이 할 말 없어지면 기후와 노동 두 개를 하겠다고 말한 지가 좀 됐다. 그게 전세계적인 츄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 두 개에 해당하는 이슈를 열심히 한다 그것뿐이지, 그걸 담론의 수준에서 어떻게 밀어 붙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오해하지 마시고. 없지는 않겠지. 그린뉴딜 뭐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서 얘기한 거는 있어. 근데 당 뭐 혹은 세력의 차원에서, 사상-강령-구체적 사업계획-실천 이런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임.
제가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뭐 그런 거나 기후적응 얘기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기후나 노동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개별 과제들을 각각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이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통합적으로 필요한 얘기라는 걸 주장하고 증명해낼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정의로운 전환, 기후적응 이런 말을 구호처럼 외치게 된단 말이지. 제가 여러차례 느낀 바는, 기후위기 어쩌구 하는 바닥은 첫째, 운동권들 늘 그렇듯 사투리가 너무 심함. 이게 심지어는 글로벌화 돼갖고 막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단어들만 갖고는 뭔 소린지 못 알아 듣겠다. 둘째, 또 운동권들 늘 그렇듯 자기들끼리 싸움… 기후적응 얘기했더니 어떤 기후위기 운동 관심 많은 분이 약간 화내더라. 적응은 뭔 적응이냐 1.5도 막는게 중요한데 하시면서… 김선생님도 말씀하셨듯 1.5도 못 막으면 그럼 다 끝장 나는 겁니까? 집에 가는 겁니까? 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의 적응을 말하면서도 싸움을 계속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획과 실제 사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걸로 설득하고 이걸 해야 한다는 것임. 그거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 집단지성이라는 걸 발휘하라는 거고, 그럴려고들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뭐 이런 저런 기회에 하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으면 또 다음에 다른 기후위기 관심 많으신 분 만나면 넌 뭔 소리냐 한다는 것임… 진보정당이 확실히 아젠다를 틀어쥐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음. 진보정당 틀 안에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옛날에는…
몰르것다. 이것도 ‘라떼는’인가 이제? 요즘 제가 옛날얘기 하면 라떼는… 이라고 합디다. 근데 요즘처럼 또 라떼는이 필요한 때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