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 촌놈이 어쩌다보니 국제선 비행기를 다 타보게 되었다. 만 나이 45세 김 선생님으로부터 오키나와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은 것인데, 다행스럽게 때가 맞아 어찌 어찌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항공사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타지 말라고들 하는 피치 항공인데,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제 시간에 떠나지도 않는다. 기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할 것은 없고 결제 과정이나 이런 데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어차피 시간 많고 들고 갈 짐 별로 없고 긴 거리가 아니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한다. 파일럿이 조종을 못하는 건 아니니…
시작부터 시간 계산을 못하는 바람에 이륙 1시간 반을 남기고 겨우 공항에 도착하였다. 김 선생님이 미리 여러 준비를 한 데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포켓와이파이 대여, 티켓팅, 출국 수속 등등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금요일 낮에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는 별로 없었던 거다. 비행기는 20분 정도 늦게 떴는데 나하 공항까지 2시간 정도가 걸렸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는 약간 당황하였다. 공항이라기 보다는 웬 창고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나하 공항은 LCC 승객을 따로 이런 창고 같은 곳에 내리게 하고 있다. 아마도 화물운항을 위한 공항 일부를 LCC를 위해 내준 듯 싶었다. LCC라고 해도 다 여기서 출입하는 건 아니고 피치와 바닐라 항공의 경우만 해당된다. 여기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특히 지카바이러스와 테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듯 싶었다. 금발 벽안의 양인은 짐을 수색당했는데, 우리 아시안들은 무사통과였다.
그 다음은 셔틀을 타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했다. 셔틀이라는 건 굉장히 낡아보이는 버스였다. 좀 달리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졌다. 물이 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그렇게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 바로 모노레일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오키나와의 모노레일은 기괴한 로고와 함께 ‘유이레일’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오키나와 말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유럽인들과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모두가 타서 북적였는데 유럽인들은 눈이 마주치면 잘 웃고 일본인들은 사과를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때까지는 포켓와이파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여서 김 선생님의 아날로그식 여행 방식에 모든 것을 맡긴 상태였다. 김 선생님은 미에바시 역 근처의 소라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놓았는데, 역에서의 거리는 거의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날로그식 여행 방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하 시내를 거의 1시간 이상 헤메었다. 덕분에 나하 시민들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주거 환경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치과가 많았던 게 인상적이었다. 결국 막스 발루라는… 우리로 치면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계단에 앉아 포켓 와이파이를 작동시키고 구글 지도를 이용했다.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해 돈을 지불하고 이런 저런 설명을 듣고 예약된 2인실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밖으로 나가 또다시 거리를 헤매었다.
[Google_Maps_WD id=2 map=2]
먼저 가야 할 곳은 국제거리였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많은 것들이 있었다. 배를 채워야했기에 아무 라멘집에 들어갔다. 원래 가려던 곳은 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 집은 ‘노 라멘, 노 라이프’라는 슬로건이 수줍게 걸려있었는데, 가게 이름은 창야(ちゃんや)이다. 마음먹고 가는 거 아니면 발견하기 힘들지 싶다. 나는 미소라멘을, 김 선생님은 매운 미소 라멘을 시켰다. 면이 구불구불해서 놀랐다. 나중에 찾아보니 홋카이도의 니시야마 제면이 만든 계란국수를 쓴다는 것 같다. 주인이 홋카이도 사람이라고 한다. 맛은 뭐 좋다. 홋카이도 라면과 오키나와 소바가 약간 혼합돼있는 것 아닌가 추측했다. 국물은 짜고 진하고, 면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꼬들꼬들이다. 귤껍질 같은 게 아주 소량 들어가 있다. 훌훌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씹히고 뭔가 새콤달콤한 맛이 퍼진다.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이다. 고명으로 올라가 있는 돼지고기는 어느 부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느낌으론 항정살 같은 게 아닐까 하는데, 지방질이 고루 분포가 돼있어 아주 맛있었다. 오리온 드래프트 삐루라고 적혀있길래 한국의 생맥주 500 같은 느낌으로 주문했는데 작은 캔이 하나 나왔다. 뭐 어쨌든 오리온 맥주는 오키나와의 자존심인 것 같다.
그 다음엔 돈키호테라는, 거대 다이소의 느낌인 쇼핑몰에 들렀다. 여러 잡스러운 물건들을 구경하며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했다. 그 다음엔 블루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블루실(blue seal)이라는 건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훌륭한 아이스크림에 주는 표장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콘을 줄 때 김마끼를 끼우는 틀 같은 데다가 얹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바닐라, 김 선생님은 고구마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니까, 부드럽고 달고 맛있다.
그리고 또 다시, 기약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거의 나하 시내를 통째로 외울 기세였다. 여러 진기한 광경을 보고 나서 아무 가게나 또 들어가서 앉았다. ‘이치마이루(いちまいる)’라는 이름인데 뭔 뜻인진 모르겠다. 고야참프루와 라후테, 맥주를 시켰다. 지친 상태여서 느낌으로 말하자면… 뭐든지 맛있고 좋았다. 고야챰프루라는 건 ‘고야’라는 괴이한 식물과 두부, 계란, 고기 등등을 같이 볶은 것인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야라는 건 우리 말로는 ‘여주’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인데 쓴 맛이 난다. 라후테라는 건 동파육의 변형이다. 삼겹살 덩어리를 간장, 설탕 등과 함께 삶아 졸인 것인데 돼지갈비 비슷한 맛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외 특기할 점은 한국엔 드문 ‘테이블챠지’가 있다는 거다. 대개 있는 것 같다. 음식을 서빙하는 점원에게 땡큐를 연발했는데, 어느 순간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었다. ‘샹큐와’ 까지는 알아 들었는데 이 다음이… 대략 “땡큐는 됐습니다” 정도 느낌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그 다음, 정처없이 걸어서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를 샀다. 나는 에비수 맥주를, 김 선생님은 무슨 30도짜리 술을 샀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국화의 눈물’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다. 전형적인 곡주의 맛이 났다. 김 선생님은 또 푸딩을 꼭 사먹어야 한다며 신선란의 뭐시기 프링 이라는 이름의 식품과 젤리화 된 과일 같은 걸 샀다. 자는 방에서 뭔가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냥 몰래 먹고 잠들었다. 김 선생님은 이미 쿨쿨 잠들었지만, 나는 쉽게 잠이 들 수 없었다. 왠지 슬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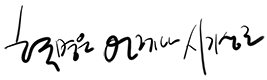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라멘에 귤껍질이라… 유즈코쇼가 들어간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가운데 작은 노란색 뭔가가 올려져 있는데, 딱 저만큼만 들어갑니다. 레몬제스트나 유자껍질이 아닐까 합니다.
오오옹… 저만큼인데 맛에 포인트가 된다니 근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