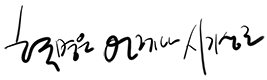신해철
10주기라고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뜬다. 유퀴즈 거기에 자제분들 나온 것도 잠깐 봤는데, 따님이 생전에 고인과 말하는 게 똑같다. 유전자의 힘이란 놀랍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음악적으로는 좋아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고인이 한참 명성을 날릴 때 나는 겉멋 든 중딩이었다. 외국 노래 아니면 아예 취급을 안 할 때 였다. 신해철과 넥스트는 ‘가요’였다. 교만하고 협량한 내 세계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요’고 ‘가수’였다. 그리고 뭔가 그 약간 느글거리는 듯한 창법도 좀 그랬던 것 같다.
고딩 때 친구 중에 고인의 팬이 있었는데, 노래방을 갈 때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니, ‘Here I Stand for You’니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였다. 그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면 뭘 부르든 막 끼어 들어서 다 같이 부른다. … ‘다 같이’는 아닐지도 모른다. 나 혼자 그런 행패를 부렸을 수도 있다. 하여간, 그 덕분에 남들에게 의미가 깊은 고인의 노래들을 거의 외우게 되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동시대성을 갖고 음악을 음악으로서 즐기고 받아들였던 건 확실히 내가 아니고 그 친구였던 거 같다. 나는 그냥 스노브, 힙스터였다. 지금도 뭐 똑바로 아는 게 없다. 가요? 가요가 뭔데? 자기가 발 딛고 선 데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간 길이 사방으로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때는 그런 걸 하나도 몰랐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 중에 신해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다. 음악이 어쨌다고 이렇게 썼지만, 이런 나조차도 ‘동시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해철의 음악적 기억은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이다.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돼 써봤다. 더 적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다. 일하러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