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생님이 논문을 다 쓰셨는지 여기 저기 좋은 말씀 막 써내시는데…
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근대 저널리즘이 그 탄생에서부터 “같은 감정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의례”였다고 말했다. 언론학자 존 하틀리는 “근대 저널리즘의 진정한 기원”이 극소수 지식인의 고담준론이 실리던 ‘더 타임스’ 같은 신문이 아니라, 수십만부씩 팔려나갔던 18세기 영국의 ‘포퍼 프레스’(pauper press)였다고 밝힌다. 거기엔 가난한 인민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보다 급진적 해방의 염원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다. 언론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돌볼 때,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자신 또한 타인을 돌보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모티브 뉴스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오래된 미래’(Old Futures)다. 그것은 진영 논리에 갇힌 부족주의적 저널리즘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극우주의에 맞설 효과적인 수단이면서 동시에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2413.html
분명한 건 해결의 열쇠가 논리가 아닌 ‘감정’에 있다는 점이다. 극우주의는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에 똬리를 튼 ‘감정 서사’이며 논리적 설득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스피노자는 ‘감정은 이성으로는 통제될 수 없고 다른 강력한 감정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고 했다.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에 따르면 증오, 혐오 같은 타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타자를 전혀 모르거나 자주 접촉하더라도 그 접촉이 피상적일 때 강해진다. 반면 타자와 ‘깊이’ 접촉하고 교류하게 되면 편견은 극적으로 줄어든다. 그것은 동질성 강화, 즉 같은 부족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 일에 가깝다. 즉, 공감을 통해 세계 속에 각자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트랙터와 응원봉이 남태령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늘 경험하던 ‘회원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누구나의 민주주의’를 목도했다. 그 기적을 가능케 한 건 깊은 접촉과 서로 돌보는 감정이었다. 다시 만들 세계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58.html
박선생님도 나이를 자셔서 그런가… 옛날 같았으면 감정 이런 얘기는 바로 비웃고 그러셨을 분인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계급투쟁의 전선 뭐 그런 얘기 할 적에를 생각해보면… 하긴 그것도 이십 몇 년 전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다 이해할 깜냥은 안 되고, 그냥 제 딴에 드는 생각을 끄적여 보면, 레닌이 말이다. 이스크라를 하던 시기가 있고 프라우다를 내던 시기가 있어요. 이스크라는 혁명가 이론가 조직가 중심의 신문이지. 이스크라 자체가 신문이자 신문보급망이자 당 조직망이다. 사상과 이론을 보급하는 역할이다. 편집국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했다. 플레하노프가 멘셰비키의 편을 들면서 레닌은 축출되었다.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노선은 세간에 이렇게 알려졌다. 멘셰비키의 당 조직론은 느슨한 연대에 기반하는 것이었으나 볼셰비키는 활동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하 조직을 원했다. 그런데 1904년 이스크라를 떠난 레닌은 1912년 프라우다를 창간한다. 프라우다의 지면은 노동자, 농민, 병사가 직접 투고한 기사들로 채워졌다. 1905년 혁명과 두마 설치 이후 변화된 정세에 맞춰 전술을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멘셰비키는 여전히 잘난척 하는 이론가 중심의 체계를 유지했다. 1917년이 되었을 때, 특히 2월 이후 볼셰비키에 대중 조직의 무게 중심이 넘어간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표준적인 운동권 서사인데, 돋보기로 그 당시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프라우다에 실린 글들도 위 첫 번째 글에 언급된 언론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글들을 보면서 1)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체감하고 2)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하고 3) 남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권하면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조직화 되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노동계급 안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겠으나,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하나의 진영이 형성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 같지. 그래서 두 번째 글의 인용된 대목에 대한 생각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인데, 타자와의 감정적 공감대를 논리와 이성과 설득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맞는 얘기 같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좌파-오타쿠 모임에서 취미를 더 열심히 즐기자 한 것이다. 오타쿠라고 한다면, 어떤 타자들과는 같은 취미라는 이미 훌륭한 공감대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서로 낄낄대는 것만으로는 취미와 현실을 연결시킬 수 없으니 비평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꼭 좌파-오타쿠 프라우다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프라모델 아니고 임마…
그냥 생각나는 걸 적어봤다. 여기 쓴 이야기는 박선생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저의 망상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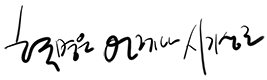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