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동안 글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탐탁치 않다. 금요일은 약속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듯 하고…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아직 남았다는 각오로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집중… 집중이 문제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흐트러진다. 자꾸 온갖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 눈은 눈대로 말썽이고…
최근 밥을 먹으면서 넷플릭스에서 화려한 일족이라는 제목의 일본 드라마를 보았다. 이렇게 썼지만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 원작은 소설이지만 여러차례 영화화 및 드라마화 되었다. 내가 본 것은 2007년판이다. 2021년에도 드라마화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젠가 왓챠에서 본 거 같아서 모처럼 보려고 했더니 없어진 거 같더라. 하여간 내용은 일종의 개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라면 대환영이다. 막장 드라마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짜식들아.
드라마를 보기 전에 사전조사를 좀 해본 바, 2007년판의 드라마는 원작에 각색이 상당히 들어가있다고 한다. 원래 원작의 주인공은 아버지인데 2007년판의 드라마는 기무타쿠가 주인공을 맡은 고로 장남이 주인공이 되었다. 게다가 원작은 장남도 잘한 일만 있는 건 아닌 다소 입체적 인물로 그려지지만, 2007년판의 기무타쿠는 기업가 정신의 화신이며 윤리적 경영자라 볼 수 있는 이상적 인물이다. 그에 반해 기타오오지 할배가 맡은 아버지 쪽은 뭐 이런 녀석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사악한 인물로 나온다. 기무타쿠와 기타오지상 두 거물이 등장한 만큼 스텝롤을 보면 배우 항목이 기무타쿠로 시작해서 기타오오지로 끝난다. 그 외 거물급 배우들의 호화캐스팅이 나름대로 굉장하다. 스즈키 쿄카, 야마모토 코지, 니시다 도시유키, 니시무라 마사히코… 이거 어째 미타니 코키 사단인데, 연기들 잘하지.
하여간. 진지한 얘기로 가자면… 2007년의 각색이 뭘 의미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본질은 기무타쿠가 나온다고 하는 업계의 사정인 것이지만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각색을 기무타쿠 중시로 하는 바람에 내셔널리즘 구현으로서의 제조업 중시 정책과 시장개방과 이윤추구가 본질이라고 하는 구조조정 중시 정책의 충돌이라고 하는 갈등 구조가 대단히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드라마는 둘 중 어디를 편드는 건가? 그건 주인공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주인공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본의 철강 산업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려는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자다. 얘를 아빠인 냉혹한 금융자본가가 지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빠 아들(그러니까 기무타쿠 입장에선 할아버지가 자기 아빠인줄)인줄 알고(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괴롭히고 코너로 모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근데 원작은 이 녀석이 주인공이 아니고 금융자본가가 주인공이다. 이게 중요한 차이다.
즉, 이 드라마는 호송선단식 경제 구조에서 금융이 제조업을 내셔널리즘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 즉 고도성장을 옹호한다. 극중에 이 공식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동력은 다시 말하지만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거기에 휘둘리는 금융자본, 즉 신자유주의적 압력에서 나온다. 이 압력이 비록 비윤리적으로 살고 혈통과 컴플렉스에 얽매이고 하지만 어찌됐건 뭔가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한 부르주아 가정을 파멸하게 만든다.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나오는 거지.
비슷한 구도를 관료들의 여름에서도 본 일이 있다. 이 드라마는 2009년에 방영됐는데, 마찬가지로 소설이 원작인 걸로 알고 있다. 극의 배경은 관료 사회지만 갈등의 선은 국내산업파와 국제파 사이에 그려진다. 국내산업파는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역시 내셔널리즘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키우는 일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고, 국제파는 시장을 개방해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는 등 중복투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주인공 카자코시 신고는 당연히 국내산업파의 리더이며 등장인물 중 악역은 전부 국제파다.
이런 드라마를 2007년과 2009년에 왜 방영을 하고 있었느냐?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2007년은 고이즈미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잔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베 신조가 집권했던 때다. 2009년은 아베 신조로 시작한 포스트 고이즈미 자민당 정권이 권력을 상실하는 시기다. 이 드라마들의 결론이 아베 신조가 지향하던 바(내셔널리즘의 맥락에서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으로 제조업 부활)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요소.
그렇다고 아베 신조가 시켜서 만든 드라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아베 신조의 주장도 뭔가의 반영일 거 아니냐… 시대의 표현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또 필요조건 충분조건 혼동해서 나한테 막 그러지 말고… 또 블로그에다가 딴 짓 했네… 이제 자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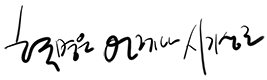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