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사람들에게 좌파-오타쿠 이야기 이후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활발한 피드백이 있었다고 들었다. 좋은 일이고, 감사드린다. 그렇게 전달받은 내용 중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얘기가 잘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얘기들도 있었다. 전달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순화 됐을 수 있고, 제가 전해들은 얘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 있으니, 또는 생각하시는 것과 단지 비슷한 얘기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라.
첫째, ‘게임적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설명이 여성 게이머-오타쿠의 존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똑같이 게임했는데 왜 누구는 2030 남성이 되고 누구는 여성 게이머가 되냐는 거지. 이 얘기는 그날 뒷풀이 자리에서도 나왔다. 난 약간 당황했다. 이건 논리학의 문제 아닐까?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런 거 있잖나. 그 자리에서 저를 예로 들었다. 저도 똑같이 게임하고 자라면서 ‘게임적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실천의 영역에선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는가?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개입하겠는가? 특히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곳에서부터 갈리는 그 수많은 사회적 경험의 차이는 게이머냐 아니냐 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더군다나 그 날의 얘기는 정치적으로 보수화 된 특정한 남성 집단의 세계관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규명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좋은 영향을 줘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지, 게임하면 무조건 인생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게임적 세계관 -> 게임커뮤니티와 유튜브 담론 -> 이를 활용하는 보수정치’의 다층적 구조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다.
둘째, 게임에서도 노력이 무조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주장.
가령 모바일 게임에서 과금으로 때우고 이런 걸 보면 그렇다는 얘기던데. 그런데 ‘노력의 대가’에서 중요한 거는, 손해(노력의 고통)를 감수한만큼 이익을 본다는 거, 즉 ‘대가’가 성립한다는 거다. 문제를 단순화 해보자. 누군가 과금으로 숙제를 건너 뛰었다, 그건 인정된다. 왜? 매일의 숙제 대신 돈을 냈으니까. 무언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한 무언가는 했을 거 아닌가? 엄마 돈? 엄마가 뭔가는 했을 거 아닌가? 어찌되었건 간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손해를 감수한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만일 똑같은 걸 주면서 누구는 1만큼 손해보고 누구는 10만큼 손해보게 한다면,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가챠룰 문제를 갖고 그 난리가 난 거다. 확률 갖고도 그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여성 등 소수자 플레이어에 한해 S급 캐릭터 1개씩 기본 지급한다고 해봐라. 어떻게 되나. 이런 건 게임의 세계에선 통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셋째, 너처럼 잘난 오타쿠가 되자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
누가 이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잘나지 않은 사람이고, 동년배 평균적인 아저씨들에 비해선 제법 오타쿠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타쿠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비해서는 오타쿠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애매한 사람에 불과하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즐기는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면서 그들만의 폐쇄적 담론 구조에 틈을 내고 현실로 끌어와야 한다는 거였다. 아마 ‘지적으로 탁월하게’라는 말을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철학적으로’라는 말에 가깝고 별 거는 아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과거에 강유원이라는 어떤 사람이 쓴 걸 주워 듣다보니까 그런 거였는데, 옛날 표현을 이제와서 쓴 것에 대해선 사과드린다. 그 당시 표현의 맥락에 대해선 일단 아래의 글을 보여드림.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새삼 따져볼 것도 없이 철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한 강의이다. 이 강의는 우선 철학의 개념을 설명한다. 강의에 따르면 철학은 “사물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탁월이란 말 그 자체가 비결정론적”이므로 “어떤 철학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 철학보다 탁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철학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철학은 가장 탁월한 것을 추구하는 이론적 학이므로 “민족이 다르거나, 가정이 다르거나, 성씨가 다르거나 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 사상과 학문(철학)의 차이가 있다. 사상은 보편적인 합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학문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합의에 이를 수 없으므로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나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합의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능력’일 것이다.
털보 아저씨가 CBS라디오에서 저공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3회에 걸쳐 강유원씨와 대담을 한 일도 있는데, 검색을 하시면 그 당시의 스크립트가 나온다. 거기서도 지적으로 탁월하게 다루는 게 철학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 스크립트를 녹취한 것은 그 당시 젊었던 정태씨였다. 정태씨는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많이 달라져 링크를 하거나 언급하거나 하기 민망해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린다.
뭐 더 있었는데, 얘기가 여기에 이르니 갑자기 슬퍼져서 이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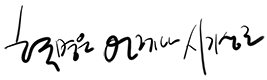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