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보니까 어제 본 칼럼도 기억이 나서 적어 놓는다. 아래의 글….
얼마 전 뉴욕타임스(NYT)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코넬대 등 6개 기관의 신경학자로 이뤄진 연구팀이 241명의 식물인간 등 의식의 징후가 없는 환자에게 ‘테니스를 치는 상상’ 등을 주입했더니 4명 중 1명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뇌파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에게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 연구는 뇌 활동을 기록하도록 고안된 전극으로 덮인 헬멧을 통해 이뤄졌다. NYT는 “이번 연구는 미국에만 최소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식물인간 환자들에 대한 접근을 바꿀 수 있다”며 “언젠가는 사고, 루게릭병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뇌 임플란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뇌 임플란트’라는 말은 그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공상과학 같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의료진들은 루게릭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환자의 뇌에 전극을 이식해 그의 ‘생각’이 만드는 뉴런의 반응과 전파를 수집하고, 이를 컴퓨터로 보낸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99% 이상 정확한 말과 음성으로 구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신경기술기업 ‘뉴럴링크’ 역시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전극이 달린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마리오카트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정말로 힘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기술기업들은 이미 사람들의 ‘정신’을 데이터로 보고 상품화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사용자 뇌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차세대 에어팟 센서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설계도를 보면 이어폰의 귓속 삽입부에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극 센서가 배치돼 있다. 한때 청춘 드라마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나눠 끼는 게 로맨스의 상징이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랬다가는 온갖 마음과 생각을 다 들켜버릴지도 모른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908/130005400/2
일단 기사에 나와있는 ‘뉴욕타임스 흥미로운 기사’ 얘기는 뭐냐면, 아마 그거일 거다. 1) 겉보기에 의식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 ‘테니스를 치는 상상’과 ‘집안을 걸어다니는 상상’을 하도록 요청한다. 2) 각각의 경우에 대한 뇌 상태를 관찰하면 테니스 상상의 경우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걷는 상상의 경우 공간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 되는데 이 신호를 수집한다. 3) 이러한 일을 반복해 뇌신호를 머신러닝해 각각 테니스 영상과 걷는 영상으로 변환해 동일한 영상이 생성되는지 보고 환자가 계속 동일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fMRI를 활용, 스테이블 디퓨전의 원리와 비슷한 거다). 4) 동일 반응이 확인되면, 즉 의식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앞으로 환자에게 “당신은 김민하 입니까? 맞으면 테니스 치는 상상, 틀리면 집안을 걸어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라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즉, 이 실험은 의식은 있지만 그걸 표현할 수단이 없어 의식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에 가깝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A라는 환자에 대해 이러한 일을 반복하여 얻은 뇌신호 A1와 영상 A1’의 관계를 다른 환자 B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다. 다른 환자 B에 대해서는 다시 뇌신호 B1을 수집하여 영상 B1’를 머신러닝을 통해 매칭하는 작업을 따로 해야 한다. 칼럼에 나오는 말과 음성 구현, ‘생각만으로 마리오 카트’도 마찬가지다. 개별 환자마다 각각의 뇌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의 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뇌 혹은 마음의 구조를 해석하거나 밝혀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단지 뇌 신호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면 대상자가 ‘나는 이러 저러한 생각을 했다’는 등의 피드백을 줘서 양자를 매칭하는 작업을 대량으로 진행한 후에 머신러닝을 돌려야 한다(사진에 태깅 작업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심신문제로 보면 기능주의의 한계를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이어폰을 나눠 낀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을 다 들켜버릴 수 있다는 상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선결돼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사이버펑크 2077처럼 의식을 통째로 어디다가 업로드 했다가 다운로드 받고 이런 염병은 여전히 SF소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나왔으니, 최근 각광을 받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BCI)라는 것들은 물론 기술적 수준으로만 보자면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패러다임으로 보면 20년 전 그대로 아닌가 한다. 심리학 개론 들을 때도 쥐 뇌에다가 전극 꽂아서 컨트롤러로 조종하는 실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걸 보면….
물론 기자는 이런 얘기엔 관심없고 이게 다 데이터이고 돈이 된다 이 대목에만 꽂혀 있는 거 같긴 하지만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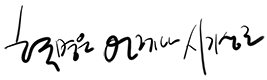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