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물론 사람들도 관심없고…. 그래서 메모를 남긴다. 그냥 비전문가의 생각이다.
원래 연금 얘기하면 크게 두 조류로 나뉜다. 이름을 붙이자면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더 받자는 게 전자고, 받는 걸 줄이는 것까지도 해야 한다는 게 후자다. 이걸 기본으로 보험료를 더 낼지 현상유지 할지, 기타 다른 소득보장 취지의 제도하고 어떻게 결합할지 등등을 각자 얘기하는 구도다. 국회가 지난 번에 합의를 도출하려다 못한 거는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으로 소득보장론에 기울어진 얘기였다. 일단 이렇게 정리.
당시 여야 간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거였다. 이 숫자 따지는 걸 모수개혁이라 한다. 용산과 일부의 주장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때는 보수언론까지 총출동해서, ‘그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하셨어야지 국회와 전문가들에게 다 떠넘기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구조개혁 얘기하면서 그나마 숙의의 단계를 거친 모수개혁을 거부하면 그건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했다.
여튼 이번에 한 얘기를 보면, 모수개혁 부분은 자동안정화장치로 퉁쳤다. 9월 초의 정부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덧붙이는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자동안정화장치란 건 결국 경향적으로 ‘더 내고 덜 받기’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얘기다. 가령 경제성장률이 뭐 폭발적으로 높아지겠나? 앞으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이건 재정안정화론자의 입장에 가까운 얘기고.
그담에 세대별 차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된다.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해도 기본적으로 고령층이 받는 연금 혜택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즉 소득대체율이 높다든가 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전체 연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한국의 경우 그렇다기 보다는 젊은층의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기금 고갈 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단순히 세대별 차등 얘기만 놓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은 지급 보장 명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소득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안다. ‘더 받자’라고 할 때 ‘기금고갈 우려’가 반론으로 나오니 ‘지급보장’으로 방어하는 거다. 즉, 앞에는 재정안정화론의 손을 다 들어 주면서 알리바이처럼 뒤에는 소득보장론이 주장하는 바도 하나 끼워넣은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다.
근데 그러면, 기금고갈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거지? 그럼 세대별 차등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대별 차등은 보험요율의 전반적 인상을 전제해야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앞서 자동안정화장치와 함께 ‘더 내고 덜 받으면서 펑크나면 나랏돈으로 메꾸는’ 게 윤통식 연금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이 방안은 재정안정화론자와 소득보장론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 둘째, 어느 입장을 떠나 이전의 숙의 과정의 내용과는 취지가 완전히 다른 안 아닌가? 셋째, 프랑켄슈타인 같은 방안이라도 임기 초에 대통령이 ‘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대략의 얼개를 제출했으면 이를 감안해서 전문가든 국회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임기 거의 절반을 두꺼운 자료만 계속 갖다 주면서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는 볼멘소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안을 내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얘기하자는 건가? 이전의 언론 지적대로 그냥 하지 말자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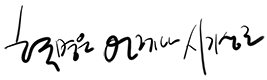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