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쓴 얘기를 생각해보다가…. 기능주의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령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BCI 연구 동향은 ‘동일론’과 ‘다수실현논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동일론(identity theory)은 쉽게 말하면 뇌와 마음이 1대 1로 대응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즉, 마음은 뇌에 대응한다. 뇌를 조작할 수 있다면 마음을 조작할 수 있다. 조금 더 논리를 점프해서… 뇌를 백업할 수 있다면? 마음도 백업이 가능할지 모른다. BCI 연구라는 게 하나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려면, 이 전제에 동일론적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이건 BCI 분야의 실용주의적 연구자들이 반드시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BCI 연구는 뇌의 상태와 의식이 서로 대응한다는 점을 증명해가는 것 같다. 앞서의 글에서 조금 다뤄본 얘기가 전부 그런 거다. 심신동일론은 증명되는 것일까?
다수실현(multiple realizability) 논변은 뇌와 마음이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전혀 다른 심적 상태라도 뇌의 상태는 동일하게 관측(심적 상태 S1과 S2가 모두 A1이라는 뇌의 상태로 표출)될 수도 있는 거다. 또는, 종이 다른 경우(이를테면 외계인) 심적 상태가 같더라도 뇌의 상태는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심적 상태 S1이 한쪽에선 A1이라는 뇌의 상태로, 다른 한 쪽에선 B1이라는 상태로…).
그런데 BCI 연구의 사례를 보면 앞서 글에서도 봤듯 인간 A에서 얻은 데이터 세트를 인간 B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는 정확히 다수실현논변에서 가정한 바에 들어맞는 사례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간에 대한 결과로 보면 마치 동일론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2인 이상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면 동일론에 대한 반박인 다수실현논변이 훌륭하게 증명되는 결과가 되는 거다.
다수실현논변까지 포괄하는 심신문제의 설명 방식을 기능주의라고 한다. 하드웨어가 어떻든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다면, 즉 동일한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듯 기능주의적 설명은 그 하드웨어 내의 매커니즘의 설명은 포기한다. 이게 기능주의의 한계다.
뉴스가 답답하니까 이런 글이나 남기고 이러는 것이다. 이제 일하러 가야돼서 여기까지 하고 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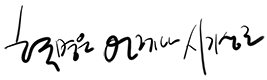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