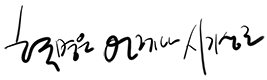어제 모임에서 느낀 게, 운동권 유관 인사들이라고 해도 탄핵이라든가 등등을 보는 시각은 범민주당 지지층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늘 강조하면서 또 공감도 하는 바이지만, 뭘 해도 다 양당제 강화로 이어지는 게 알맹이 없는 진보만 안고 사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병립형을 하든 연동형을 하든 다 양당제 강화… 그게 뭘 하든 다 자본주의가 체제내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임.
아무튼 보수언론을 보는 게 일인데, 요즘 심상찮다.
1) 조선일보는 윤정권을 권위주의 정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윤 모 교수가 대표적인데, 투표일에도 의미심장한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다. 윤정권을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 민주당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총선을 양대 세력의 대결구도로 표현한 거다. 다만 이재명-조국은 구제불가고 한동훈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식이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조어가 등장했다는 거다. 내가 알기로 윤 모 교수가 이 표현을 여기서 처음 쓴 건 아닌데, 결국 이건 ‘독재’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일보의 이런 규정은 선거 지고 나서도 이어지는데, 보수적 학자와 애매한 학자, 비교적 진보적 학자를 모아 선거 평가를 한 거였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학자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한국 사회의 ‘모럴(도덕)의 추락’ ‘반(反)권위주의 성향의 확산’ ‘주류 세력의 변화 조짐’ 등의 큰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기존 보수 이념을 고집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보수’를 아우르지 못한다면 보수 정당의 축소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 좌담에 낀 윤 모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책임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의 50대까지도 ‘선진국민’이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항의 구호를 외친 사람의 입을 막는 ‘입틀막’이나 ‘대파 소동’을 보고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심 모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정부·여당을 ‘더 큰 권위주의’라고 느꼈던 것”. 기사는 이렇게 해설한다. “과거 경제성장기에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 때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도 용인했지만 지금처럼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걸 바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치러진 총선들은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기사는 이렇게 해설한다. “한국 보수세력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개가 규제 완화를 바라는 ‘자유주의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 2016년쯤이고 그게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박 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다. “2022년 대선에선 이들이 다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 다시 떨어져 나간 것”, “여당 입장에선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2) 미래 세대를 띄우는데 집중한다.
금요일 조선일보에 이준석 인터뷰가 크게 실렸다. 이 지면은 보수의 미래로 채워졌다. 지면 구성이 이준석, 김재섭, 천하람 흐름이다. 이날 동아일보, 한국일보엔 김재섭 인터뷰가 들어갔다. 다시, 오늘 조선일보는 김재섭 인터뷰다. 금요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남, 고령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30대 초선인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을 지도부로 전면에 내세우자는 아이디어다”란 대목이 나온다. 독이 든 성배라는 걸 뻔히 아는 김재섭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배경에 어떤 집단-세력으로서의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1)의 논의와 연결해 이해해보라.
3) 제도를 탓하기 시작했다.
소선거구제가 국힘 피해를 키웠다는 식의 주장이 보수언론 전반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가령 조선일보 오늘 기사 제목이 <득표율 5.4%p差, 지역구 의석 수는 63.4% 얻은 민주>다. 더 의미심장한 건 사설인데, 마찬가지로 제목이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이다.
4) 개헌을 암시하기 시작했다.
앞서 사설 얘기 이어서 하자면, 입법 독식은 선거제도 탓하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행정 독식은 뭔가? 다음의 내용을 보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앞섰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며 청와대를 나왔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왕적’이라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에 이어 많은 문제에서 오만과 독선, 불통이 이어지다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는 단 1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2·3등 후보를 찍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는 전부 무의미하게 된다. 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다. 승자 독식, 패자 절망 구조는 여야와 지지자 간 극한 대립을 부르게 된다. 그런 갈등으로 누가 무슨 이익을 얻었나. 여야와 국민 모두에게 결국 해로울 뿐이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제 보수의 미래 중 하나인 천하람씨가 개헌에 대해 발언한 것에 눈길이 간다.
◇ 신율: 네. 이준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다음 대선까지 3년 확실한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랍고 중요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도 헌법상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이 입에 담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저희가 저희의 공약으로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중임제 개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선투표제의 어떤 제도 개선을 저희가 공약으로 넣었고.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 좋게 평가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본인께서 본인 임기를 단축하는 형태로 개헌을 하신다면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도적 안정성을 해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천하람: 어쨌든 저희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특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부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식의 임기 단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조선일보의 어떤 논설 등을 통해서도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 신율: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개헌 말씀하실 때 4년 중임제 개헌 말씀하셨죠?
◆ 천하람: 네.
◇ 신율: 대통령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천하람: 아니요. 저희는 집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4년 중임제도 절대선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떤 면에서요?
◆ 천하람: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같이 정치의 첫 선거가 대통령 선거이신 분 같으면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 초부터 폭주를 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은 하지만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평가를 두는 것이 더 낫고 또 잘하는 대통령이라면 5년보다는 8년 정도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궁금한 게요. 뭐 아까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안 들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의원내각제 낫지 않아요? 왜 내각제 얘기는 안 하십니까?
◆ 천하람: 저희도 내각제를 완전히 배척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수준이, 어떤 신뢰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은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바로 내각제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95238&s_mcd=0263&s_hcd=01
…
인터뷰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대략적인 구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선거제도-개헌(임기단축)-특검을 하나로 묶는 협상이 물 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짚을 게 범야권 대권주자라는 이재명-조국 콤비의 사법리스크 문제다. 호사가들이 즐겨 하는 얘기,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대권주자 입장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좋으니 대선이 앞당겨지는 게 좋고, 그러니 탄핵을 하고 싶어하지 않겠느냐는 거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검이든 보수 내 균열이든 그런 일이 확인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개헌이라는 명분으로 임기단축이 가능하다면? 이 논의에 이들로서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정리하면…
1) 보수는 앞으로도 집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선거 이후 조선일보 주필은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다”라고 썼다.)
2) 따라서 ‘자유주의 보수’를 포섭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키우고자 하는데 변하지 않는 윤석열 덕에 쉽지 않다.
3) 제도(선거제도, 권력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통해 집권 가능성을 더 높이는 논의도 진행하고 싶다.
4) 윤석열의 임기 단축이 탄핵을 원하는 민주당-조국당 일각의 니즈와 맞다면 선거제도개편-개헌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을 거다.
5) 이게 실제로 되려면 국힘 이탈자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즉 ‘변하지 않는 윤석열’이란 변수의 제거) 특검은 자유주의보수-민주당-국힘비주류를 묶는 아교가 될 수 있다.
이게 일단은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 탄핵-개헌 게임이라 할 만한데,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그 게임 테이블에 이른바 진보쓰의 자리는 없다는 거…